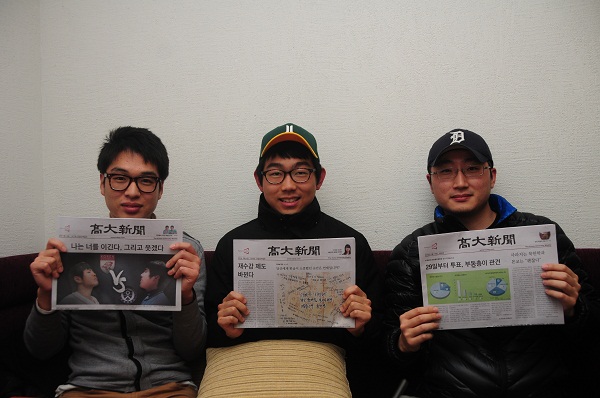
같은 기획을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글날 특집호는 보도의 내용이 빈약했다는 지적과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는 평가로 나뉘었다
연원규 한글날에 대한 기획 기사 양은 적절했다고 본다. 1면의 ‘당신이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때는 언제 입니까’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보고 많이 공감을 했다. ‘특집호’라는 이름으로 발간된다면 이 정도 양의 기사는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형섭 하지만 학교신문이라면 보다 학내 사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학보사로서의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굳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16면 중 4면에 걸쳐 다룰 필요가 있나 싶다. 반면 같은 호 ‘16년 만에 열린 세종 학생총회’ 기사는 비중이 무척 작았다.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인턴과 창업 연재는 어떻게 봤나
조빛나 기억하기로는 인턴기사보다 창업기사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턴 관련 기사가 좀 더 많이 연재됐으면 한다. 또한 좀 더 많은 전공에 관한 인턴 경험담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형섭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이나 창업은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신문에서 다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 비슷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다. 좀 더 다양한 진로를 소개했으면 한다.
만약 인턴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독자라면 도움이 될까. 너무 얕은 내용이지 않나
박민규 취업준비생을 완벽히 만족시킬 정도로 기준을 높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분명 관심이 있다면 전문 잡지 등을 찾아볼 것이다. 특정 사람의 수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일반 독자가 만족할 정도면 될 것 같다. 고대신문은 창업취업 전문지가 아니니까.
박형섭 고학번이고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 창업 기사를 보면 사실 아는 내용이 많다. 크게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아 이런 길이 있구나’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깊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반면 독자를 배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박민규 가독성이 떨어지는 기사들이 고대신문을 읽지 않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고대신문을 읽고’를 작성해야 하니까 꼼꼼히 읽는 것이지 수치나 공약 같은 것이 덩어리로 제시돼 있으면 굉장히 읽기가 힘들다. 내용이 많지 않아도 간결히 정리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쉬는 시간에 읽는 학생이 많은데 글씨로 빽빽한 면에 집중하기는 힘들다.
연원규 매주 독자를 위한 정보나 컨텐츠의 비중이 들쑥날쑥하다. 학내 사안을 다루는 페이지가 많았다가도 갑자기 양이 적어진다.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다.
박형섭 학내 사안의 심층취재가 아닌 단순한 사건보도가 주를 이루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해석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할 때 신경을 더 썼으면 한다. 가끔 그래프나 표 등의 기본적인 수치가 틀리는 경우가 있다. 1685호 1면의 파이 그래프를 다 더해보니 100이 아니었다. 만약 이 점을 확인한 사람들이라면 기사를 읽어보기도 전에 실망할 생각할 것이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신문을 읽어도 재미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빛나 학내 신문은 <대학내일> 같은 잡지가 아니다. 일간지와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학내 신문으로서는 적절한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민규 재미만 있다면 신문이 아니지 않나. 고대신문이 꼭 재미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기자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문 지면상에 실린다는 점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
단순한 수치나 사안을 제시하는 기사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박민규 1680호 1면에 실린 ‘외국인 교원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기사를 예로 들자면 전공별까진 어렵더라도 단과대 혹은 캠퍼스 등으로 단위를 나눠 분석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박형섭 신문이 기사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료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은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한 수치를 기록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 주관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다고 생각하나
조빛나 사회적 이슈를 줄 때는 주관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쪽, 혹은 그 이상의 시각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 독자에게 결정의 여지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연원규 사회 문제는 ‘팩트’만을 다루기 어렵다. 즉 객관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것인데 만약 써야 한다면 이 주제가 왜 등장하는지 정도는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의 의도를 명확히 한 후 문제를 다뤄야 한다. 4대강이나 FTA관련 기사는 왜 다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박형섭 주관적 해석의 여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일부 상황을 보고 전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주관 개입을 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문 내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공통적이었다. 보도기획 기사와 칼럼의 논조가 달랐다는 점 때문인데
조빛나 문제의식은 기사로 전달해야 한다. 신문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려는 노력은 좋지만 여러 시각은 기사 내에서 전달할 일이다. 기사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칼럼을 싣는 것은 일관성을 잃어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형섭 같 은 사안에 대해 기사와 사설이 입장을 다르게 이야기했던 호도 있었다. 사설과 기사는 논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 따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일단 신문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독자로선 혼란스럽다.
연원규 대학토론대회 준우승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론면엔 진정한 토론이 없다는 내용을 담아 인터뷰 하는 사람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물론 맞는 지적이지만 기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박민규 내 경우에는 딱히 가치판단이나 논조를 신문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기사에는 가치판단을 많이 집어넣을 수 없고 그 자체를 날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칼럼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환기시켜줬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교내외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고민 끝에 판단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통일성을 원하는 독자에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딱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상적인 기사나 기획이 있다면
연원규 고연전특집호가 기억에 남는다.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대신문이 적절하게 다뤄줬던 것 같다.
박민규 연재코너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특히 교수님들이 연재하는 ‘나의 유학시절은 말이야’를 재밌게 읽고 있다. 학생들이 교환학생에 관심이 많은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박형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박원순, 나경원 후보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쉽지 않았을 텐데 다른 대학과 함께 진행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인터뷰 내용도 대학생과 관련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