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대는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를 포함해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세계 대학평가의 수치에서도 교토대는 이공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임이 드러난다. 2015년 QS 세계대학평가 생명과학 분야에서 교토대는 세계 16위를 차지해, 51-100위권을 기록한 국내 주요 대학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화학 공학 분야에서 교토대는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고대신문은 올해 1월 초, 교토대를 직접 방문해 천체 물리학의 석학 미사오 사사키(佐々木節, 교토대 유카와 이론 물리연구소) 교수와 교토대 학생들을 만나봤다. 교토대가 이공계 분야에서 저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로운 학풍

사사키 교수| “여기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의 연구소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한 교수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교수와 함께 팀을 이뤄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모두가 독립적인 개별 연구를 진행하죠. 일정 수준 연구가 진행되면 그 주제에 대해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자신이 연구한 것을 선보이곤 하죠.”
교토대 학생들은 원하는 분야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부한다. 이는 연구뿐 아니라 수업에도 적용된다. 교토대 지구혹성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아오야기 나오키(青柳直希) 씨는 “이번 학기에 5과목을 신청했지만, 관심 있는 수업 3개만 수강했다”며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교토대는 강의 출석체크를 하지 않아 학생들이 학과 공부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 나오키 씨가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교토대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다양한 클럽활동과 포켓세미나에 참석하며 과외활동을 즐긴다. 포켓세미나는 전공계열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업으로, 소규모 토론으로 진행된다. 나오키 씨는 지난 학기에 ‘나노과학의 최첨단’이라는 포켓세미나에 참여했다. 나오키 씨는 “포켓세미나에선 교수가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한다”며 “다른 포켓세미나에서는 경우에 따라 함께 공장 견학을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토대에서 소립자물리학을 연구하는 박민규 씨는 같은 수업에서 자주 보는 학생들끼리의 교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교토대에서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제미(ゼミ)’를 하는데, 제미는 일본어로 ‘세미나(seminar)’라는 뜻이다. 박 씨는 “학생들이 제미를 통해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과외활동의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학풍은 교토대의 오래된 전통이다. 1987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도네가와 스스무(利根川進) 박사는 교토대 재학시절 화학을 전공했지만, 생물학 연구에 빠져 졸업 전까지 바이러스만 연구했다. 당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부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교칙이 있었지만, 교토대는 학구열이 높은 스스무 씨를 높이 평가해 졸업시켰다.
전폭적인 연구지원
사사키 교수| “교토대의 경우엔 행정직원이 별도로 배치됩니다. 학생들이 잡다한 업무를 할 필요도 없고, 교수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 연구소에도 여자 행정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대학원생들이 행정업무를 할 필요가 없어 연구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토대 대학원 연구실에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원이 있어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오롯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다. 한국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연구뿐 아니라 행정업무도 떠맡는 것과 비교된다. 교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철원(생명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한국에서는 돈이 많다면 교수가 사무원을 별도로 고용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통 교수나 대학원생이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말했다.
교토대에서 유학했던 국내 교수들은 교토대가 정부 정책이나 유행하는 연구 분야에 휩쓸리지 않고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유행하는 연구에 편승하기보다는 원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철원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윤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가 유행했을 때 관련 연구에 많은 연구자가 쏠렸다”며 “유행하는 연구에 가려진 연구 분야들은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토대는 다년간 논문 실적이 없어도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 분야를 계속하도록 지원한다. 예상규(서울대 의과학과) 교수는 교토대가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해낸 것은 교수의 연구 분야를 존중하는 교토대만의 분위기가 주효했다고 말했다. 예 교수는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면역학 전공 교수는 몇 년 동안 공동연구를 제외하고 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자신의 분야를 계속 연구할 수 있었다”며 “이는 학교가 교수 개인의 연구를 존중하고 성과를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이공계 대학엔 ‘도제(徒弟)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연구실은 교수, 준교수(associate professor),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박사생, 석사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연구실 내에서 승진 개념으로 후임이 양성돼 교수법, 연구지도, 연구실 운영방법 등 암묵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도제시스템 덕에 교토대 이공계 연구실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교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홍연 세종부총장은 도제시스템과 연구 자료의 아카이빙(Archiving)에서의 본교와 교토대의 차이를 언급했다. 조 부총장은 교토대가 이공계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교토대에는 수십 년 이상 된 연구실이 많다”며 “수십 년간 축적된 지료들은 후임 교수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본교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국내 대학과 교토대의 차이는 자유로운 학풍에서 오는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시스템에 있다. 예상규 교수는 국내와 일본 대학의 학풍 차이 이전에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예 교수는 “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익힌다”며 “문제의 원리를 알기 전 요령을 익히는 태도는 그 아이가 자라 교수가 됐을 때 학문 연구를 하는 것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기초와 원리에 대해 익히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결과와 성과를 내려고 하는 풍토가 이공계 분야의 기초과학 연구 문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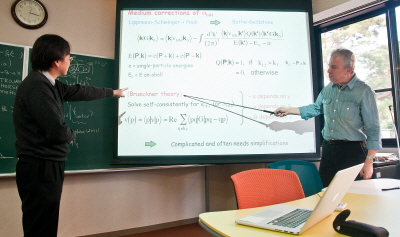
이러한 국내 풍토는 정부가 ‘돈 되는 연구’에 연구비를 투자하고, 교수가 ‘성과 중심의 연구’를 위해 유행하는 연구에 편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윤철원 교수는 “현재 교토대도 법인화됐지만 기초연구를 하면서 성과의 중요성이 더해졌다면, 국내 대학은 아직도 논문의 수, 연구비 액수 등의 정량적인 평가와 성과 중심적인 풍토가 있다”고 말했다.
이공계 분야의 교수들은 가시적인 성과에 목말라 하는 연구 분위기로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공계 분야에서 교토대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를 국내와 비교해봤다. 예상규 교수는 “정부와 대학이 기초 연구에 투자하지 않고, 교수도 기초연구를 하지 않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는 원천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연 세종부총장은 “교수를 믿고 학문에 대해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토대는 교수의 권위가 서 있고, 학문과 연구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에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