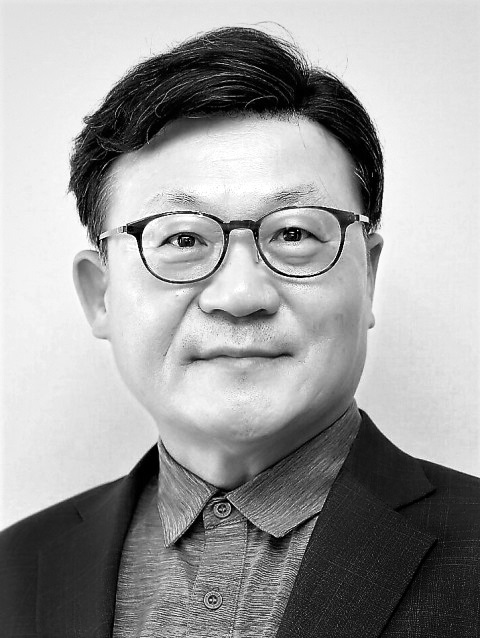
고대신문은 1947년 해방공간의 혼란 속에서 대학과 지성이 나아갈 바를 환히 비추는 등불로써 빛을 밝혔습니다. 창간 이후 일흔 한 해의 역사 또한 혼돈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고대신문은 나라와 민족, 대학과 그 구성원의 갈 길을 비추는 밝은 등불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고대신문이 자랑할 것은 대학신문의 효시로서의 긴 역사가 아닙니다. 일흔한 해 한결같이 자유·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을 지키고 돋우며 어느 시대 어떠한 탄압에도 맞서서 정론직필의 길을 걸음으로써 독자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왔다는 것이 긍지의 원천입니다.
지난해 창간 70주년 기념행사에는 지방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달려온 250명이 넘는 동인들이 모여서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고, 동인문집 <우리는 기자였다>와 <고대신문 연재만화 전집>을 들추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오탁번 동인이 축시에서 노래했듯이 “기자의 한 생애를 3년 만에 뚝딱 마친 뼛속까지 진짜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키운 것은 8할이 고대신문이었다” “고대신문과의 만남은 운명이었고, 그 만남이 인생의 지침을 돌려놓았다”는 고백을 동인문집 여러 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고대신문 기자로 활동한 시기는 풋내가 가시지 않은 청춘기이며 그 시간도 길어야 3년이었지만 그 수련의 밀도와 강도는 인생 전체를 지배할 만큼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 시대 숨통을 죄는 통제와 억압 속에서 우리는 조그만 신음소리라도 내려고 안간힘을 썼고 학우들은 용케도 그 기사의 행간을 읽었습니다. 고대신문을 받으려고 홍보관 앞에 길게 줄을 선 학우들의 행렬을 보면서 보람에 전율했고, 애써 만든 신문의 기사 내용이 보안당국의 사전 검열에 걸려서 배포금지 되어 울분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한 동인들이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동인회는 “좋은 스승과 벗들이 이 신문을 통하여 서로 엉키고 뭉치어 찬란한 업적을 이 민족과 이 대학의 전통 위에 더함이 있기를 기하는 바이다”라는 창간사의 마지막 선언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창간 71주년을 맞은 오늘, 고대신문이 그 소명을 다하며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디지털화 되어 종이매체의 존재감이 곤두박질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럴수록 고대신문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가야 합니다. 디지털의 바다에서도 고대신문의 등불은 빛나야 하고 나아가 고려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이끌어가는 글로벌 매체로서 발전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모교의 지원과 고대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기대하며 동인회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정윤석 고대신문동인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