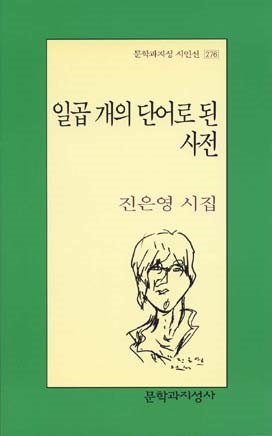
국문과 현대시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시적인 것은 무엇인가’이다. 수업을 인용하자면 이는 ‘일상 지각의 영역에 균열을 내고 지각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진은영 시인의 시집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의 표제작은 다분히 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봄, 슬픔, 자본주의, 문학, 시인의 독백, 혁명, 마지막으로 시에 이르는 일곱 단어를 재정의한다.
2연을 인용한다. ‘슬픔/ 물에 불은 나무토막, 그 위로 또 비가 내린다’ - 시인에게 슬픔은 그저 ‘슬픔’이 아니어야만 한다. 슬픈 마음을 그냥 ‘아, 슬프다.’라고 하는, 언어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시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 사유하면서, 모든 것을 어떤 단어 안으로 포섭하려 하는 추한 본능이 있다. 감정마저도 언어를 통해 재단된다. 정말, 정확히, ‘슬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존재하는가? 있다면 대체 무엇인가? 어떤 속성들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아야만 그것이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어가 가리키는 바로 그 ‘슬픔’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하지만 다른 무수한 감정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묶어버린다.
우리는 살아가며 언어화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마주친다. 찢어지게 고유한 경험들, 이 최초의 순간에, 그 감정을 ‘슬픔’이 아니라 ‘물에 불은 나무토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다. 시는 사전을 쓰는 것이다. 그 사전은 아주 개인적이며 특별하지만,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어느 지점을 향해 나아간다.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한 소설이 있다. 주인공은 너무 기억력이 좋아, 그저 나뭇잎을 보더라도 전에 본 나뭇잎과 지금 보는 나뭇잎의 차이를 완벽하게 파악해 버린다. 그에게 있어 나뭇잎 둘 사이에는 ‘나뭇잎’이라는 단어로 도저히 묶어낼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노력이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들을 치열하게 꺼내는 것, 오늘과 또 다른 오늘을 구별하는 것이다.
일상을 통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복이 차이를 만드는 법이다. 아주 다른 하루보다 빗나간 하루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그 지점, 일상 지각의 균열에, 오늘이 오늘인 이유에 더 간절해야 한다. 시의 마지막 연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 ‘시, 일부러 뜯어본 주소 불명의 아름다운 편지/ 너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
김선하(문과대 국문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