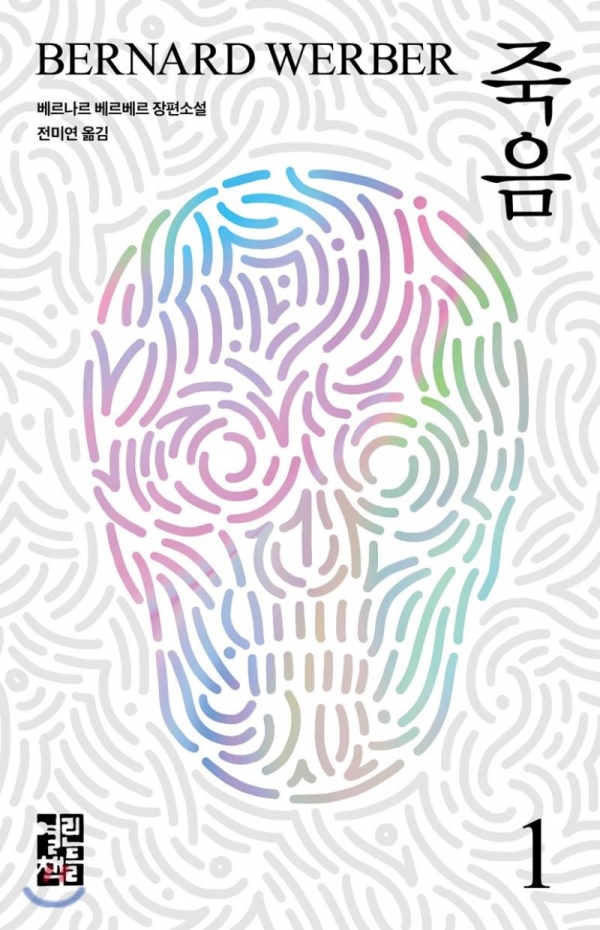
<죽음>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전지연 옮김
“누가 날 죽였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자신’이 살해되자 주인공 가브리엘 웰즈는 떠돌이 영혼이 돼 사건의 내막을 파헤친다. 가브리엘은 내세에서, 영매인 뤼시 필리피니는 가브리엘이 실종된 남편의 흔적을 같이 찾아준다는 조건으로 현세에서 수사를 펼친다. 그렇게 좁혀진 용의자는 넷. 가브리엘의 쌍둥이 형 토마 웰즈, 옛 애인이자 유명배우 사브리나, 장르소설 작가인 가브리엘을 혐오하는 문학가이자 평론가 장 무아지, 그리고 가브리엘 소설의 편집자 알렉상드로 드 빌랑브뢰즈. 각자의 혐의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장르소설 작가로서의 고뇌, 실종된 뤼시 남편의 진실, 그리고 반전이 소설의 끝을 기다린다.
현세와 내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주는 환상은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다. 가브리엘은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영혼을 만나는데, 그중 유명인이 다수 있다. 셜록홈스의 아버지 코넌 도일부터 전통 문학계의 대가 제임스 조이스까지 각계 작가들은 물론이고 나폴레옹 황제, 발명왕 에디슨 등이 출현한다. 특히 유명 작가들의 영혼들이 ‘좋은 소설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혈투를 나누는 장면은 중압감마저 선사한다. 독자들이 생각하는 죽음 뒤의 세상은 여러 형태를 띠겠지만, 작가는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그럴듯한 내세를 소개해 상상력을 자극한다.
실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투영된 가브리엘의 고민은 또 다른 묘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니 가브리엘은 전통 문학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프랑스 문학계에서 철저히 무시당한다. 이에 가브리엘은 자신만의 소설 쓰는 방법, 이유, 가치 등을 얘기하며 세간의 평가에 담담히 반박한다. 소설에서 장 무아지는 그의 소설을 ‘쉬운 소설’로 평가하는데, 독자들은 가브리엘의 독백을 통해 작가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장르소설이 쉬운 소설인지, 쉬운 소설이 나쁜 소설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어떤 일에 집중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외부 반응에 무뎌질 정도로 고취된 의식에 빠진 상태를 ‘트랜스’라고 한다. 내세란 다소 철학적인 주제를 깊이 다룬 책은 무궁무진하겠지만, 그런 책들을 읽으며 죽음 뒤에 세상을 마음껏 상상할 정도로 트랜스가 되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터다. 반면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자조적으로 표현한 쉬운 소설들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몰입도를 높여 재미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쉽게 트랜스 상태로 몰고 간다. 어찌 보면, 어려운 소설보다 쉬운 소설이 철학적인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 더운 여름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가지고, 쉬운 소설인 <죽음>을 읽고 트랜스에 빠져 자신만의 내세를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김인철(공과대 신소재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