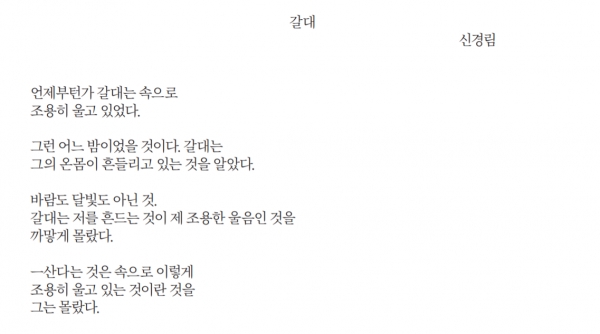
그리움을 그리움으로,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절이 있다. 혹자는 객기(客氣)라 부르는 그 무모함을 나는 겁(怯)이라 부르곤 한다. 유약한 속내를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니까. 그러므로 첫 문장의 의지 부정(받아들이지 않는)을 능력 부정(받아들이지 못하는)으로 바꾼다면 ‘제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한 시’로 이 이야기를 축약하는 것이 곡해(曲解)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설해 버리면, 시린 문장을 읽고 흔들리는 마음을 설명할 길도 사라지고 말 것이므로
좀 더 횡설수설해 본다. 이 이야기는 갈대를 의인화한 우화다. 그러나 이 우화는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아픔의 흔적을 짧은 문장으로 간추려 놓았을 뿐. 따라서 이런 우화에 대한 소감은 필경 자전적인 이야기로 귀결하는 겸손이 필요할 것이다.
“스물한 살의 어떤 철부지는 바쁘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보며 진취적인 사람이라도 된 양 으스댔지만, 심심할 뿐이라고 애써 외면하던 감각들이 실은 외로움이었음을, 내가 벌인 모든 일이 결국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발버둥이었음을, 지금은 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른 채 괴로움에 흔들리는 생(生). 그런 내게 의지가 되어 주는 건 늘 함께 고민하는 마음들이다. 혼자 흔들리는 몸짓은 함께 부대낄 때 비로소 ‘울음’이 될 수 있다. <갈대>에 편승하면 내 투박한 문장도 누군가와 함께 흔들릴 수 있으리란 기대와 울음이 되리란 바람을 담아서
시선을 까무룩 한 줄에 줄여 본다.
“슬픔을 슬픔으로, 아픔을 아픔으로. 혼자 흔들리는 갈대는 울 수 없으니 너는 나의, 나는 너의 울음인 거야.”
박지훈(사범대 국교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