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만 끝나면 나가 버려야지.’ 지난 학기 취재부 기자로 있는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이자 동기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다.
내 주변 사람은 고대신문이 사람 잡는다고 한다. ‘넌 도대체 뭐 하고 살길래 잠도 제대로 안자냐, 수업도 잘 안 나오느냐, 얼굴 한 번 보기 왜 이렇게 힘드냐’는 말이 친구와 선후배의 입에서 떠나질 않았다. 실제로 잦은 회식과 밤샘으로 수업에 잘 들어가지 못했고, 과제도 제 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바쁜 일정에 매여 남자친구를 서운하게 한 일도 잦았다. 술 한잔 하자는 친구들의 말을 거절해야 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터라 적어도 한 두달에 한번은 내려갔던 고향엔 지난 학기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주변 사람에게 소홀해지는 자신이 괴로웠다.

이런 갖가지 일들로 난 점점 ‘학생기자활동’을 부담스러워했다. 고대신문을 멀리하고 싶었다. 처음 한 달여 동안 온 힘을 다해 취재하던 열정도 사그러들고, 기사 초고를 늦게 내서 취재부장님과 국장님을 괴롭혔다. 학점도 잘 챙기고, 착착 스펙을 쌓아 안정적으로 취업과 졸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08학번으로 학보사 활동을 하는 내가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다. 취업 얘기를 꺼내며 나를 우려하는 엄마와 통화하고 나면 내가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건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 영리하게 현실을 쫓지 않고 아둔한 짓을 하느라 대학시절을 ‘허비’하는 게 아닐까 초조했다.
학생 기자 활동이 힘들다는 말에 ‘에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라는 게 내 생각이었고, ‘고대신문 인턴기자로 합격하셨습니다’란 문자에 기뻐하며 고대신문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건 바로 내 자신이었다. 지금 한 학기를 되돌아보니 스스로 선택한 고대신문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지난 학기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 왜 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을까. 학점과 스펙이 중요하단 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인데 거기에 갇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사랑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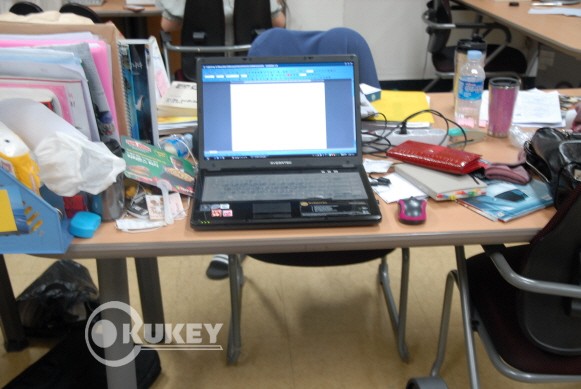
이번 방학부터 난 수습기자가 아닌 정기자로 활동한다. ‘나갈꺼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지만 나가지 않았다. 이곳을 떠나는 것 보단 고대신문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사를 쓰는 게 제대로 된 내 자신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대신문을 제일 뒤에 두었던 그 시절의 나와 달라지겠다. 스펙과 학점으로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매료되는 일에 몰두하자.
이번 방학 동안엔 지난 학기동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며 겪었던 일들, 배운 사실들은 짚어봐야겠다. 처음 맡았던 연구실 기자재 취재를 하다 교수님께 무례를 범해 혼난 일, 보과대 셔틀버스 기사에서 직원의 멘트처리에 신중하지 못해 곤란하게 했던 일, 부지런하게 굴지 않아 소중한 취재원을 잃은 일들.. 되돌려 생각해보니 난 고대신문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내 나름대로 성장했다.
기자 활동을 막연하게 꿈꿨던 시절엔 너무나 기사를 쓰고 싶었고 내 글이 지면에 실린단 사실이 두근거렸다.
지난 한 학기 동안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지 알게 됐기 때문에. ‘멋진 저널리스트’의 이면을 본 나는 어느 새 그 모습에 실망하고 있었다. 화려함의 이면에 치열함과 고통스러움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피하려 했다.
지난 나를 되돌아보는 지금, 난 다시 치열하게 기사를 쓰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