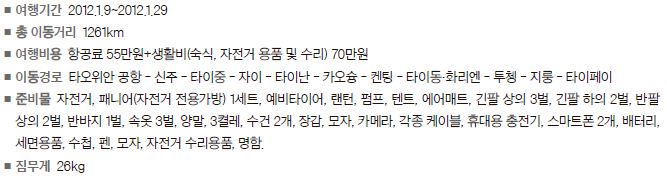
여행 일주일째인 1월 16일, 카오슝을 벗어나 켄팅(Kenting)으로 향했다. 켄팅까지 가는 동안 마땅한 식당이 없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웠다. 대만에는 시골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편의점이 흔하다. 게다가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은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꽤 종류가 다양하다. 켄팅은 카오슝에서 150k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중에 하루는 캠핑을 하기로 해서 여분의 도시락을 하나 더 샀다. 그런데 캠핑을 할 만한 마땅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눈에 보이는 한 분교로 무작정 들어갔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교무실 비슷한 곳으로 가보니 선생님으로 보이는 여자 분이 퇴근하려는지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곳에 텐트를 쳐도 되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밤에 순찰을 돌기 때문에 안 될 거란다. 하지만 나도 필사적이었다. 잘 곳이 없다고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 여자 분은 내가 불쌍했던지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줬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었다.
스위스에서 온 경희대 교환학생
다음날에는 켄팅에 도착했다. 남부지방인 켄팅은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웠다. 대만에서 손꼽히는 휴양지로 인기가 많은 켄팅답게 내가 머문 호스텔에는 스위스, 미국, 덴마크에서 온 배낭 여행객이 있었다. 그 중에서 스위스에서 온 ‘데니’와는 금세 친해졌다. 비록 언어는 잘 안 통했지만 동갑이라서 그런지 서로 편했다. 그는 나에게 맥주를 줬고, 나는 오는 길에 산 구아바를 안주로 줬다. 데니는 작년 한 해 동안 경희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고,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에 아시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우린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다음날, 나와 정반대 방향으로 대만을 여행하고 있는 데니는 내가 떠나 온 카오슝으로 향했고, 나는 데니가 떠나 온 타이동으로 향했다.
공짜인 줄 알았더니
켄팅을 떠나 이제 타이동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서쪽과 다르게 동쪽 지역은 산간지방이라서 쉽게 지쳤다. 꽤 올라왔다고 생각했지만 오르막길은 끝이 없었다. 자전거에 실린 짐들이 계속해서 나를 뒤로 잡아끌었고, 그럴 때마다 뭔가 버릴 건 없는지 생각했다. 잠시 멈춰 서서 쉬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날은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오르막길만 올랐던 것 같다. 점점 산으로 올라가니 오후 4시 밖에 안 됐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왼쪽으로 아주머니 한 분과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탄 스쿠터 한 대가 따라 붙었다. 아주머니는 내게 잠시 멈춰 보라고 손짓을 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멈췄는데 알고 보니 계속 가봤자 산이라서 잘 곳이 없고 날도 금방 어두워질 테니까 자기 집에서 자라고 하신다. 웬 횡재인가 싶어 고맙다고 했는데 “찌빠(700달러)!”란다. 그럼 그렇지. 공짜가 어디 있나. 좀 비싼 것 같아 “우빠이(500달러)!”라고 외쳐 방값을 깎았다. 아주머니 집은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의 2층 집이었다. 2층은 여행객들을 위한 방으로 활용하는 모양이었다. 그날 손님은 나 하나 뿐 이었다.

웅장한 자연 앞에서
여행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대망의 화리엔에 도착했다. 화리엔은 해발 2000m에 이르는 ‘타이루거 협곡’으로 유명한 곳이다. ‘타이루거 협곡’은 오랜 세월 침식작용으로 산이 갈라져 생긴 협곡인데 대만의 필수 관광코스로 손꼽힌다. 화리엔에 도착한 나는 설 연휴라서 무료로 운행 중인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가는 동안 밖을 보니 비가 오는데도 자전거로 협곡을 오르는 ‘철인’들이 보였다.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전거로 오르는 것을 포기한 나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러웠다.

버스를 타고 40분 가까이 올라가니 해발 1100m 부근에 있는 톈상(Tian Shang)에 도착했다. 더 올라가려면 걸어서 가야하는데 나는 걸어서 내려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간상 더 올라가진 않았다. 곧장 안내소로 가서 타이루거 협곡 지도를 챙겨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내내 엄청난 자연 앞에 위축됐다. 절벽과 절벽사이를 걷는데 나는 한 마리 개미나 다름없었다. 버스로 40분을 올라온 걸 생각하고 내려가는 데 2시간이나 걸었는데도 중간지점이었다. 협곡 아래에 있는 셔틀버스 시간 때문에 좀 더 걸음을 재촉하는데 승용차 한 대가 앞에서 멈춰 섰다. 가까이 갔더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화리엔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신다. 나는 걸으면서 타이루거 협곡을 더 보고 싶어서 거절했다가 2시간이나 더 걸어갈 자신이 없어 결국 차에 탔다. 협곡에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부는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었다.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자 아주머니는 지금이 설 연휴라서 길이 복잡하고, 다음 목적지인 뚜쳉(Toucheng)까지 가는 길이 험하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셨다.

방수가 안 될 줄이야
아주머니 말대로 길은 굉장히 험했다. 산을 깎아 만든 도로라서 고작 왕복 1차선 도로가 전부였고, 오토바이 전용도로는커녕, 갓길도 거의 없어서 도로로 달리다시피 했다. 차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자전거가 흔들려서 균형 잡기도 만만치 않았다. 비 때문에 길도 미끄러웠다. 하루 종일 긴장한 채 자전거를 탄 그날은 자는 것도 곤욕스러웠다. 산 속이라서 인가가 없었고 비를 피할만한 곳도 없어서 비가 내리는 데 일단 텐트를 쳤다. 하지만 ‘옥이네’에서 산 3만 원짜리 텐트가 방수까지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 밤 11시쯤 등이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텐트 천장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텐트는 빠르게 젖어갔다.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급하게 짐을 정리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랜턴에 의지해 짐을 싸는데 입에 물고 있던 랜턴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물에 젖었는지 켜지지 않았다. 급한 대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정리를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워낙 산 속이라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우의를 입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온 몸이 축축했다. 기온도 많이 떨어져 이빨이 덜덜 부딪힐 정도로 추웠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한참을 가니 폐가를 한 채 찾을 수 있었다. 이젠 문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문을 열었더니 안에 있던 고양이가 밖으로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랐지만 비를 피하는 게 급선무였다. 다행히 지붕은 멀쩡해서 비는 피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뜬눈으로 오전 6시까지 지샜다. 여행 중 가장 힘든 기억이다.

그 이후로는 오르막이 별로 없는 북부지방에 도착했고, 어느새 종착지 타이페이에 도착했다. 해냈다는 성취감보다 여행이 끝났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 여행을 하며 만난 사람들은 대만은 시계방향으로 돌 때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가 느낌이 180도 다르다고 말한다. 그만큼 대만은 아름다운 곳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전거를 들쳐 엎고 대만으로 훌쩍 날아가 다시 여행을 시작하고 싶다. 나의 자전거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