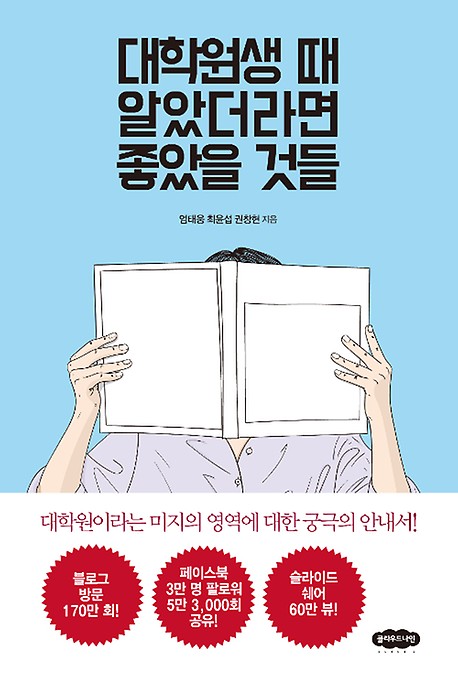
엄태웅, 최윤섭, 권창현
정신없는 한 학기가 지났다. 바이러스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마스크가 당연한 옷차림의 하나로 그려지는 듯하다. 재난의 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는 제각각이겠지만 앞으로의 대한 고민은 모두가 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진로를 두고 여러 가능성을 고민한다면, <대학원생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이란 제목의 책을 소개한다.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은 없지만, 학부생으로서 많은 도움과 위로를 얻었던 책이다.
세 명의 공동 저자는 각각 대학원생, 대학원 졸업생, 교수의 입장에서 대학원의 이야기를 풀어 간다. 대학원 진학의 본질, 연구실 선정 시 주의할 점, 연구와 논문 작성의 방법론 등 대학원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자세한 조언을 건넨다. 공유되는 정보가 빈약한 대학원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풀어낸 점은 이 책의 장점이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펼치는 담론이기에, 대학원에 뜻이 있다면 이 책을 해답지보다는 손글씨 교본 정도로 보아야 한다. 회색으로 프린트된 그들의 시행착오는 참고자료 정도는 되겠지만 그 위로 직접 한 자 한 자 적어 나갈 때 자신만의 필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엿볼 수 있는 큰 메시지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다. 엄태웅 작가는 대안으로서의 선택, 도피로서의 선택은 최악을 막을지언정 최선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한다. ‘남들이 하니까’, 혹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회사 생활보다 나을 것 같아서’와 같은 막연한 이유들로 대학원을 찾는다면 그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잘 풀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대학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별 정보 없이 진로를 정하면 남는 것은 환상뿐이다. 운이 좋으면 환상이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낭패를 겪고 적성과 안 맞나 보다 하며 다른 길을 알아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 살아지는 대로 살지 말고 직접 앞을 내다보며 방향을 정하고 물을 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대학원에 대한 마침표로 가득찬 이 책이 던지는 인생의 물음표가 신기했다. 내가 꿈꾸던 진로는 정말 대안이나 도피가 아니었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쩌면 이 물음들 자체가 그동안 해 온 선택들이 진정한 고민 없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학과 사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읽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박내은 (글로벌대 글로벌경영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