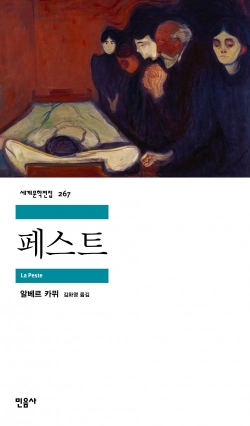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다. 사람들은 이전의 일상을 더는 누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조차 조심스럽고, 타지로 여행을 떠날 수도 없으며, 외출은 늘 마스크를 동반하여 답답하고 불쾌하다.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이다. 카뮈의 소설 <페스트> 안에는 우리의 현실이 자리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놀라울 만큼 깊이 공감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인간 역시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며, 각 개인의 소박한 헌신으로 재앙을 버텨 나가기 때문일 테다.
카뮈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세상의 부조리를 목격했다.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 그 안에서 카뮈는 신에 기댈 수도, 그저 체념할 수도 없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겠지만, <페스트>를 통해 우리는 끝없이, 무한히 저항하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임을 깨닫게 된다. 손 쓸 틈도 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절망에 빠진다. 재앙과도 같은 현실에서 신부 파늘루는 그것 또한 신의 뜻이라고 설파한다. 죄 없는 어린아이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신의 사랑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대해 의사 리유는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저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당장 눈앞의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지이다. 부조리가 가득한 삶 속에서 인간은 반항하고 또 반항해야 한다. 시시포스의 신화처럼, 결국에는 다시 떨어지고 말 거대한 바위를 쉬지 않고 굴리며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카뮈가 <페스트>에서 제시한 반항의 방식은 흥미롭다. 그는 인간의 본질은 선하다고 믿었으며, 영웅주의를 경계했다. 훌륭한 행동을 과하게 칭송하는 것은 인간의 주 원동력이 악의 또는 무관심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청의 말단 서기 그랑은 가장 대표적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는 이미 늙어 많은 일을 할 수 없으며 우스꽝스러운 이상에 집착한다. 그럼에도 그는 작은 선의로 보건대에 합류하여 통계를 담당했고, 특유의 성실성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리유나 타루 이상으로 그랑이야말로 보건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조용한 미덕의 실질적 대표자였다.’
눈앞에 닥친 재앙에 대항하는 건 성자도 영웅도 아닌 가장 보통의 시민이다. 구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조용한 미덕으로부터 온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한다. 의료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우리는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용납할 수도 없기’에 저항해 나가야만 하며, 이는 우리 마음속의 작은 선의들이 모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전혜빈(의과대 의예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