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과 어버이는 한 몸과 같다’라는 옛말이 있다. 제자에게 선생님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마음의 어버이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주저하게 된다는 것도 스승과 어버이가 닮은 점이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스승의 은혜가 점차 희미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르침은 불현 듯 가슴 속에 떠오른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감춰뒀던 본교 제자의 마음, 스승의 마음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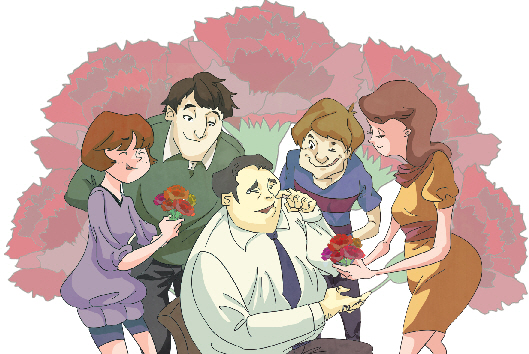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지는 은사의 향기
박용남 문과대 교수·영어영문학과
“대학 신입생 무렵, 교양수업으로 ‘한국사’를 들었습니다. 민족 사관에 입각한 강의였는데 식민 사관의 잔재로 인해 편협하던 제 역사관을 완전히 뒤엎는 수업이었죠. 그 강의를 지도하신 분이 지금은 교직을 떠나신 최복규 교수님이세요. 일제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격하시키면서 만들어낸 말이 창경원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때의 가르침은 제 전공인 영문학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문학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관점, 폭넓은 시야로 재구성될 수 있단 것을 알게 됐죠. 영문학을 서구인의 관점이 아닌, 제 3세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발상도 당시 강의에서 배운 바를 응용한 것이죠. 비록 개인적으로 다가가진 못했지만 최복규 교수님은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은사이십니다”
이국진 본교 강사·교양교육원
“석사 과정에서 지도교수로 모셨던 안병학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본교 한문학과에서 한시를 주전공으로 가르치셨어요. 체구는 작지만 단단한 풍모를 지닌 분이셨는데 달콤하고 구수한 파이프담배를 즐겨 피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인상 깊이 남아 있어요. 대학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한시 번역이나 논문을 발표할 때면 언제나 매섭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는데 어찌나 긴장되던지. 저도 수업시간마다 식은땀을 흘렸죠. 그러면서도 술자리에선 제자들과 허심탄회하게 학문과 인생을 논하며 밤을 지새우던 따뜻한 분이셨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건 석사논문을 준비할 때 일이에요. 작은 하숙방에서 가만히 선생님의 박사논문을 필사하는데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이 신기하게 가라앉더군요. 선생님께서 2005년 가을에 쓰러지신 후 지금까지 병실에 계신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선생님께 공부로 칭찬을 한 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여태껏 그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학예부 배성환 주임
“윤세영 교수님은 비 오는 날만 출석을 부르시는 걸로 유명했어요. 해가 쨍쨍한 날이면 학생들에게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자네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음악을 즐기며 플롯을 멋지게 부는, 낭만적인 선생님이셨죠.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에서 일하게 됐는데 윤세영 교수님이 관장님으로 계신 거예요. 박물관인이 되고서야 저는 윤 교수님이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됐죠. 그런데 제가 박물관에 들어간 이후부터 교수님은 제게 단 한 번도 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찌나 일을 혹독하게 시키시던지 처음엔 혼자 투덜대기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박물관 사람으로서 제게 꼭 필요한 일이었단 걸 알게 됐고 그 분의 배려에 새삼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죠”
박종찬 안암총학생회장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임신행 선생님이 생각나요. 선생님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신 저명한 아동문학가셨어요. 그 무렵 저는 체구가 작고 허약한 편이었는데 때문인지 선생님께서는 제게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셨죠. 선생님께서 내신 단편 동화집 중 한편은 저를 주인공으로 한 것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감동받았고 아직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죠. 주로 시골, 어촌이 배경인 동화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바닷가인 마산에서 자란지라 선생님 글의 영향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유년기를 보내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도 그 때의 기억 때문인지 항상 푸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