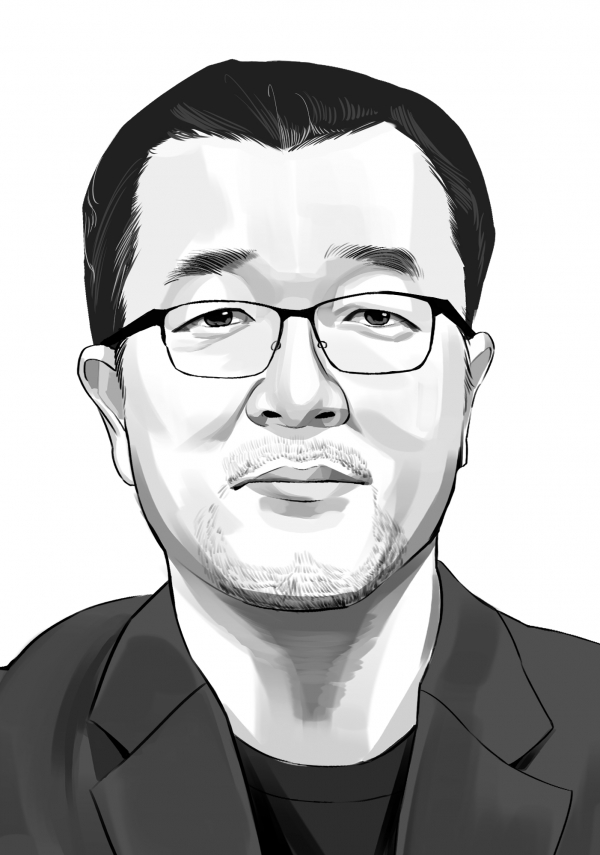
문화스포츠대 교수·미디어문예창작학과
시는 곱고 다정한 말로 된 글이라기보다 멀쩡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글이라고 한다. 이 말엔 편한 힐링의 언어가 중병까지 치료해주지는 못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우리는 병들었는데도 멀쩡할 때가 많다. 시는 또 평화를 선전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려 하는 글이라고 한다. 덮어 두면 좋을 문제들을 파헤치려 할 때가 많은 것이다. 온갖 현행 질서에 의문을 던지며 위장된 평화에 반대하는 것이 문학의 한 소임이어서 이리라.
고통을 덮는 치유는 치유가 아니고 분쟁에 눈감는 평화는 평화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프지 말라고만 권하는 힐링이며 계속 피 흘리라고 명령하는 평화일 테니까. 마주하지 않으면 고통과 갈등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삶의 어려움은 늘 어렵사리 표현된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사진을 고유한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무의식적 요소를 풍크툼(Punctum)이라 했다. 풍크툼은 불현듯 엄습해 찌르듯 마음에 상처를 내는 사진의 예기치 못한 힘이다. 그러나 그 통증이 불러내는 진실과 감동에 치유의 가능성이 들어 있다.
고통과 치유, 분쟁과 평화의 시적 표현도 돌연히 이루어질 때가 많다. 시는 쉽게 치유와 평화의 말을 낳지 못하며, 시름하고 괴로워하다 한순간 그것에 스치는 것 같다. 음악가 김민기는 어느 인터뷰에서 <늙은 투사의 노래>로 더 알려진 자신의 곡, <늙은 군인의 노래>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1980년 5월의 뉴스에서 그는, 광주의 시위대가 ‘투사의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뒤이어 진압군이 ‘군인의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장면을 보며 탄식했다고 한다. 그 풍크툼은 그의 통증이면서, 비극적 역사의 상처 난 얼굴이 자기를 보여주고 새겨준 시적 순간이었다.
이처럼 시적 순간은, 개인 내면은 물론 사회 정치적 사건의 갈피들에서 섬광처럼 번뜩인다. 이태 전에 화제가 됐던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 롤도 그렇다. 그는 그날 헤어 롤을 문득 잊었다. 그래서 그 ‘사자머리’의 뒷부분에 그것은 대롱대롱 돋아났던 것이다. 거기 무엇이 맺혀 있었을까. “역사의 법정에 당사자로 선” 사람의 긴장과 두려움, 소명의식과 불안감이 섞인 무의식의 정동이 스며있었을 것이다. 그의 정신이 가야 할 곳으로 정신없이 가고 있는 동안 무언가 더 깊은 것이, 헤어 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진심의 이미지였을 것이다.
지난 해 4월의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인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외신이 “세계를 뒤흔든 악수”라 표현한 그 만남은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는 처음 보는 종류의 사건이었다. 우리는 ‘도보다리’를 감싼 격렬한 고요에 지펴 두 정상이 칠십 년간의 어둠을 걷고, 대립과 싸움의 수심을 내려가 어떤 역사의 심연에 들어 있는 걸 보맑은고딕았다. 그곳은 맑은 봄볕과 새소리로 장식된, 그러나 긴장과 고통의 자리였다. 두 사람은 명백한 외세의 제약 아래 놓인 한반도의 운명을 폭탄을 만지듯 다루고 있는 듯했다.
이 극적인 장면 또한 시를 떠올리게 한다.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했다. 그런데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아프게 들었다. 두 사람이 모두를 대신해 말했거나 힘을 다해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내용은 아마 한반도에 주어진 유일한 상생의 길, 평화의 로드맵에 관한 것이었을 터이다. 위장 평화는 물론 대결과 전쟁으로는 열 수 없는 그 길의 어려움이 침묵 속에 힘겹게 전해졌다고 하면 과장일까.
큰 기대를 모았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렸다가는, 닫혔다. 한반도는 다시 조금 어두워졌다. 정세를 모르는 글쟁이가 덧붙일 말이 없을까. 그 회담이 열리기 한 주 전, 멸종되었다던 갈라파고스 거북이 113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1906년부터 지금껏 거북은 홀로 더디게 걸었지만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거북은 의연히, 불현듯 나타났다. 이것 이상의 시는 없을 것 같다. 한반도의 평화도 그렇게 오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평화를 향해 가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