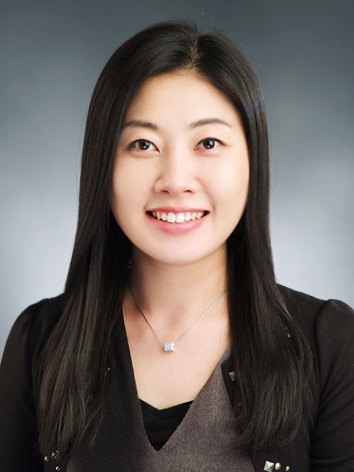
2회에 걸쳐 한국 현대소설을 두 편 소개하려고 한다. 첫 장면은 이미상 작가의 단편소설에서 찾았다. 이미상 작가는 2018년 웹진 ‘비유’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소설집 <이중 작가 초롱>(2022)을 출간했다. 첫 단편집을 출간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상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통용될 정도로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작가다.
이미상의 단편 ‘모래 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이중 작가 초롱>, 문학동네, 2022)으로 가보자. 이 소설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특징 때문이다. 하나는 이 소설이 전통적인 소설 작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단편소설은 서양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스 비극의 구성이나 근대소설에서 확립된 인물 형상화 방식도 그러하다. 말하자면 ‘이러이러하게 써야 좋은 단편소설이 된다’는 규칙 같은 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규칙에 따라 쓰다 보면 소설들이 다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상 작가는 이 소설의 첫 장면에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이런 소설 작법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다른 하나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흥미로운 연합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이를 인물들의 유니온(union)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 유니온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난다.
이 소설은 ‘모래 고모’와 두 조카인 ‘목경’과 ‘무경’의 이야기다. 모래 고모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매를 키워준, 둘에게는 두 번째 엄마 같은 존재다. 고모의 삶도 여러 역경을 겪었다. 별명인 ‘모래’라는 말도, ‘쌀보리 게임’을 하다가 나온 말이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먹을 다른 사람 손에 넣었다 빼면서 쌀이나 보리를 대는 게임 말이다. 쌀을 부를 때 잡으면 잡는 이가 이기고, 빠져나오면 주먹을 넣은 이가 이기는 게임이다. 그때 고모가 제안한다. 모래도 넣자고. 쌀도 보리도 못 되는 하급 인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래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고모의 자칭(自稱)이고, 그게 그대로 고모의 별명이 된 것이다. ‘모래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면서 온갖 어려움을 견뎌낸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다. 훗날, 고모의 장례식장에 와 있던 목경이 고모와 언니와 대중목욕탕에 갔던 일을 추억한다. 목욕탕에는 욕탕의 물을 더럽히는 장애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있었다. 모두가 질겁해서 탕을 빠져나올 때, 고모와 무경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탕에 머문다. 그것은 고모가 ‘모래 고모’로서 평생을 실천해 온 삶의 방식이다. 아픈 사람 곁에서 있기. 그 일을 함께 겪기. 그것은 고모가 조카들에게 가해진 비난과 힐난,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어온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언니 무경은 고모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 이 모든 것을 목경은 거울을 통해 지켜본다. 거울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있다. ‘(증)둥지 협동조합.’
거울에 적힌 이 글귀를 탕 속의 아이와 엄마, 모래 고모와 무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니온’의 표식이라 해도 좋겠다. 욕탕의 온기 속에서 드러나는 이 글씨 자체가 인물들의 삶을 요약하는 은유인 셈이다. 모래 고모의 삶과 이들의 유니온, 고통을 겪는 인물들이 둥지를 이루고 협동하여 조합(유니온)을 이루는 것. 작가의 이름을 빌려, ‘미상(未詳)’의 존재들의 유니온이라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 멋지게 표출되어 나온다.
양윤의 고려대 학부대학 교수·문학평론가
